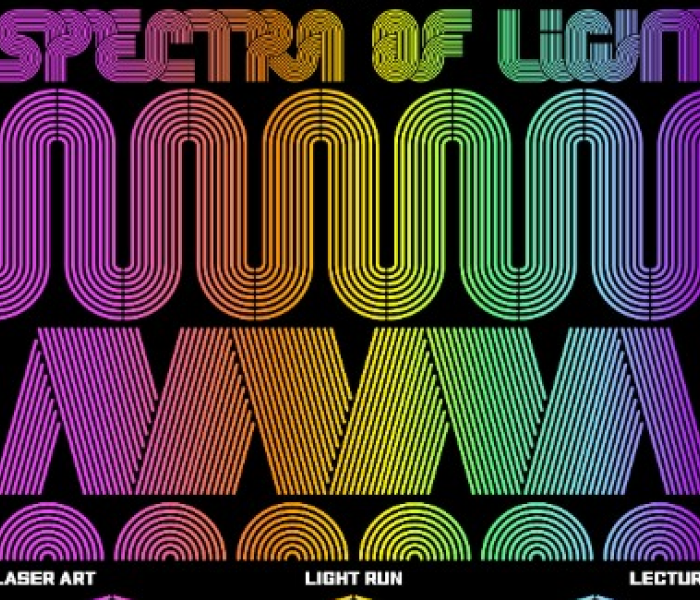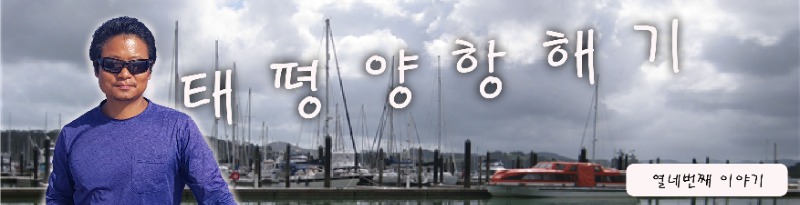
< 이전 글 : 크레이그씨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 >
■ 10월 30일(화) 해 뜨고 비 오고 반복 = 체류 13일 차 (요트 생활 7일)
샌드플라이와의 전쟁, 그리고 뜻밖의 갈등 – 마리나에 묶인 13일 차
오전 3시 10분(현지 시간 7시 10분) 기상. 흐린 하늘 아래 해가 떴다가 비가 내리기를 반복하던 중 동쪽 하늘에 크고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랐다.

전날 저녁, 일행 중 한 분이 옆 요트 쪽으로 소변을 보다가 해당 요트 주인의 강한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이 마리나 사무실에 전해졌는지, 오전 6시 30분 마리나 관리인이 찾아와 누구였는지를 물으며, 반드시 외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우리는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생각에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다.




오전 9시, 박종보 님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계류장 수도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요트 안에서 선장님과 한 회원 간에 큰 언쟁이 벌어졌다. 그 회원은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결국 요트를 떠나 마리나 휴게실에서 출항 때까지 머물겠다고 했다.
그동안 매일 저녁 와인이나 위스키를 사 와 동료애를 보이던 그는, 선장님의 반복된 무시와 조롱에 결국 등을 돌린 것이다. 일행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선장님은 “딜리버리하다 보면 한두 명은 중간에 하차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앞으로 몇 달간 좁은 공간에서 함께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벌어져 상당히 언짢았다.
오전 10시 40분, 내 다리는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며 가려움이 계속됐다. 마땅한 조치가 없어 차가운 바닷물에 다리를 담갔는데, 물속에서는 그나마 가려움이 덜해 틈만 나면 바닷물에 다리를 담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정대 님이 걱정하며 마리나 사무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사무실에서 다리를 보여주며 먹는 약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약국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하고, 바르는 간단한 약은 마리나 입구 마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곧바로 마트로 가서 발을 보여주자, 직원이 바르는 약을 건네며 “아주 잘 듣는다”고 했다. 뿌리는 약도 있다고 했지만, 우선 바르는 약만 구입하기로 했다. 가격은 한화로 약 8천 원. 나는 미국 달러로 계산하려 했으나, 직원은 뉴질랜드 달러나 카드만 받는다고 했다. 파이히아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가 통용돼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곳은 아니었다. 발 상태는 심각하고 약은 필요했지만, 나에게 뉴질랜드 달러가 없어 난감했다.

사실 나는 한국을 출발하기 직전까지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선수단을 인솔해 전라북도 전국체전에 참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급히 짐을 싸 오느라 미국 달러만 챙기고 카드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다행히 김정대 님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주어 약을 구입할 수 있었고, 우리는 약을 들고 요트로 돌아왔다.
돌아와 “바르는 약을 샀다”며 보여주자, 선장님이 제일 먼저 약을 달라고 하셨다. 약을 건네자, 옆에 있던 김정대 님이 “바르는 약 말고 뿌리는 약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다. 나는 혹시 공금으로 사주시나 했지만, 선장님은 아무 대꾸 없이 약만 바르셨다.

오후에는 박종보 님이 해양용품점에서 도구를 사 와, 낚시줄에 납을 틸러로 눌러 ‘끄심 발이’를 제작했다.

‘끄심발이’는 바다낚시, 트롤링, 또는 요트 항해 중 하는 낚시에서 줄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눌러서 원하는 수심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작업을 ‘끄심’(눌러 고정함)+‘발이’(봉돌, 무게추)라고 불러서 ‘끄심발이’라고 함. 쉽게 말해 낚싯줄이 잘 가라앉도록 눌러 고정하는 작은 무게추라고 보면 됨

< 다음 편 : 10월의 마지막 날인 할로인 데이 >